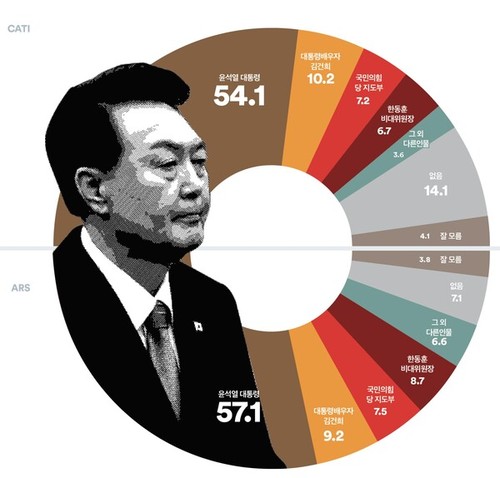밖에서 벌어지는 바이든의 불장난은 트럼프보다 더 위험...알라스카 미중 격한 언쟁은 ‘신냉전’으로 가는 신호탄
미국은 지구상에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바이든의 불장난은 트럼프보다 더 위험...알라스카 미중 격한 언쟁은 ‘신냉전’으로 가는 신호탄미국은 지구상에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이흥노 미주동포
작금의 국제정세는 미국 새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요란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 전 세계를 제멋대로 주물럭거리고 요리해왔다는 걸 부인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권의 표본이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우쭐대며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지난 1월6일을 기해 영낙없이 미개국으로 전락하는 광경을 전 지구촌이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지켜봤다. 트럼프의 쿠테타는 그동안 비틀거리며 수명을 다해가고 있던 미국식 민주주의를 더 일찍 끝장냈다는 점에서 후하게 점수를 받을만 하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태산 보다 많은 온갖 국내 국제 문제를 떠안고 출범했다. 국내 문제에서는 특히 트럼프의 실패한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숱한 난제들의 대부분은 혁명적 개혁과 발상의 전환 없이는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요원하다고 하겠다. 분열된 사회에는 증오가 이글거리고, 부의 편중에 따른 계층 간 불평 불만은 시한 폭탄이고, 날로 증가하는 인종 증오 범죄는 절정에 다달았고, 총기사고와 마약에 연루된 강력범죄의 가파른 상승, 등은 심각한 난제 중 난제다.
대외문제에서는 추락된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고 국제사회로 부터 ‘왕따’ 된 신세를 면하는 게 시급하다. 동시에 세계헌병 노릇을 지체없이 단념하고 모든 나라들과 친선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절박하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거덜난 세계 경제를 살리는 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걸 할 수 있고, 정작 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라는 건 아주 자명하다.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다같이 잘 살자는 인간 본연 자세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미국으로선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가 분명하다.
허나, 초장 부터 바이든은 정도를 걷지 않고 길을 잘못 들었다. 바이든 정부 출범후 알라스카에서 미중 2+2상견례가 있었다. 블링컨이 먼저 대중 공격 포문을 열었다. 이것은 앞으로 ‘신냉전’으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러를 겨냥한 편가르기에 나섰다. 부시가 즐겨 써먹던 ‘우리편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논리 냄세가 진동한다. 아시아에선 ‘쿼드’를 꺼내들었다. 유럽에서는 ‘노드스트림2’ 거부를 독려하고 있다.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미독 관계가 일그러지고 말았다.
바이든과 그의 외교 안보 참모들은 오바마 정권에서 이란 핵문제를 타결했고,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를 성공시킨 수준급 외교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래서 전임자가 일방적으로 거덜낸 이란, 쿠바 문제가 조기 원상회복되고 나아가 ‘싱가포르 조미선언’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세계 평화 번영에는 눈을 감고 추종세력을 끌어모아 패거리 정치, 즉 ‘신냉전’을 벌이지 못해 환장하는 것만 같다. 그런데 세계적 비상시국에 왜 하필 낡은 고물 냉전에 목을 맬까?
미국은 경쟁자의 존재를 절대 인정 수용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을 추월하려는 자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돼야 할 대상이라는 요상한 철학의 소유자다. 21세기에 들어서자 ‘미국은 석양으로 기울고, 중국이 떠오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4~5년 후에는 동방의 중국 인도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이미 중국의 부상을 의식한 오바마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폈고, 트럼프는 무역전쟁에 이어 반중운동을 줄기차게 벌였다.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돼 적개심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다. 지구상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병든 미국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신냉전’이라는 긴급 처방전을 내놓은 것 같다. 미국은 자고로 ‘적’이 있어야 한다. 냉전때의 적은 쏘련이고, 냉전 이후에는 중국이 적이 됐다. 적이 없으면 일부러 만든다. 실정을 희석시키고 이목을 중러라는 적에게 돌리는 교묘한 통치수단인 셈이다. 최근에 촘스키 세계적 석학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러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한다는 건 미국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했다.
촘스키는 나아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며 기대를 접은 듯이 발언했다. 트럼프가 거덜낸 대외정책들을 즉각 시정 수정하지 않고 고수하는 모양새는 촘스키의 혹독한 비판에 한결 무게가 실린다고 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입만 벌렸다 하면 인권, 민주, 독재 타령이다. 아니, 정말 미국이 인권 소리를 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눈만 벌어지면 죽이고 살리는 광야의 무법천지가 아닌가…현 바이든 정권이 얼마나 급했으면 ‘단말마적 최후 발악’을 할까라는 생각이 앞을 가린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